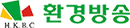지구여행과 하늘문

지구여행과 하늘문
어느 노시인이 말했다. 시인 하나가 태어나려면 하늘이 문을 열어주어야 가능하다고. 시낭송회가 있던 날이다. 노시인이 본행사가 시작되기 전 한 말이다. 그 노시인은 황금찬 시인이다. 사람이 시 같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 분이다.
어떤 사람은 지상에 떠도는 자음과 모음으로 욕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음과 모음으로 시를 짓는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소리로 소음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만든다. 가진 만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는가가 진정 중요하다. 황금찬 시인은 시 낭송회 자리에서 이런 말도 했다. 시인 한 사람이 태어나면 이 세상에 도적놈 하나가 없어진다고. 황금찬 시인의 말에는 감동이 들어있다. 큰 말이어서 그렇다.
시를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 시인이 아니라 시를 읽을 줄 알고 시를 써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인이다. 시를 읽지 않고 시를 써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시인이다. 누구의 가슴 속에서나 발표하지 않은 시가 있다. 사람의 가슴 속에는 발표하지 않은 시가 봄날의 새싹처럼 파릇파릇하다.
나는 언제부턴가 시인이 되고 싶었다. 시를 쓸 줄도 모르고 배울 사람도 없었다. 마음속에 막연히 시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을 뿐 누구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왠지 다른 나라의 이야기 같기만 했다. 마음에 담고 있었던 시인의 길이 열린 것은 우연 같지만 마음이 열어준 길이었는지도 모른다. 마음에 담고 살았던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책방에서였다. 교보문고에 들러서 잡지를 찾아보다가 시인의 되는 길로 등단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서 글을 쓰고 있었지만 내가 쓰고 있는 글이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도 제대로 몰랐다. 스승 없이 혼자 습작한 것을 세 군데 보냈다. 그 중에서 두 군데서 연락이 왔다.
참 신기했다. 등단이 된 것이다.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혼자 써왔던 글이 등단의 계기를 마련해주어 시인이란 칭호를 갖게 된다. 등단이 되어서 처음 만난 분이 박재삼 시인이었다. 지금도 당시의 상황이 그려진다. 시인은 뭔가 다르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오지만 나로서는 특별한 마음으로 박재삼 시인을 찾아갔다. 장미담배만 피우는 박재삼 시인은 작은 체구에 언뜻 보면 초라해 보인다. 말도 차근차근 조용히 하신다. 출판사의 조언에 따라 등단인사로 장미담배와 음료수를 사 들고 사무실을 찾았다. 당시 박재삼 시인은 탑골공원 뒤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먹고 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바둑 관전평을 쓰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바둑기사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밖으로 나와 다방으로 들어갔다. 다방에서 차를 마시며 등단인사를 온 후배 시인을 위한 덕담은 없고 자신이 살아가는 힘든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 도중에 잠시 앉아있으라며 일어선다. 그리고는 계산대로 가서 찻값을 계산하고 다시 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왜 미리 계산을 하시지요?”
“손님이 찻값을 계산하게 하게 할 수는 없지요.”
손님에 대한 배려였다. 시간이 제법 흐른 후에 알게 되었다. 정말 가난한 시인이었고 끼니를 걱정할 만큼 어려웠던 시인이었다. 가난한 형편임에도 찻값을 미리 계산하는 마음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았다. 가난은 언제나 슬픔을 꼭 끌어안고 있다. 가난해 본 사람은 누구나 박재삼 시인 같은 마음을 안다. 그리고 박재삼 시인이 당시 교과서에 실리는 유명한 분이라는 것도 후일 알게 되었다. 「울음이 타는 가을강」「천년버릇」같은 시사에 남는 대단한 작품을 남기신 분인 것도 나중에 알았다. 나는 시인을 만나 본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시를 배워보지도 못한 사람이어서 더욱 그랬다.
박재삼 시인의 시는 잔잔하고 소박하며 작다. 작지만 큰 세상을 열게 하는 힘이 있다. 가난이 주는 곤란과 생활의 어려움을 몸으로 겪으며 산 시인이다. 가난했기에 눈물 같은 시를 쓴 시인이었다. 우주의 마음을 마음에 담지 않고서는 눈물을 흘릴 수 없다. 눈물은 우주의 흐름이 사람의 감성의 결을 따라 흐르는 강물이다.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물이다. 사람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다 이해하고 나서야 눈물은 흐른다. 눈물이 뜨거운 것은 가슴을 거치지 않은 눈물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시인이지만 시를 종종 잊고 산다. 세상이 힘들고 벅차서 그렇다. 먹을 것을 마련하고, 스스로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다. 이 세상은 낙원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다. 더 없이 아름답고 살아볼 만한 곳이지만 경험 없이 태어난 인생이어서 어느 길로 가야할 지 모른다. 인생길은 모두 초행길이다. 같은 길을 걷더라도 시간과 환경이 달라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인생길은 그만큼 두려움이 따르는 길이다. 지치고 고단한 몸을 대지에 편안하게 기대고 누워서 하늘을 보면 별들이 반짝인다. 아름답다. 우리는 별을 여행할 것을 꿈꾼다. 어린 왕자가 되어 황홀한 별 여행을 꿈꾼다. 아침까지 남아 반짝이는 금성, 생명체가 살아있을 지도 모른다는 화성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은은하게 마음을 적시는 달빛. 별자리마다 많은 별들이 반짝거린다.
살아있다는 것이 축제여야 한다. 살아있음을 자축하라. 우리는 축복 속에서 태어났다. 그 축복 속에서도 울면서 태어났다. 우리의 삶은 이미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울음으로 이 세상과의 대면을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태어난 곳을 가만히 상기해 보라. 두 다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인생의 날 중 맑은 날만을 고집하면 사막이 된다. 흐린 날이 많은 곳은 울창한 밀림이지만 맑은 날이 계속 되는 곳은 사막이 된다. 인생의 성공은 맑은 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흐린 날로 만들어진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아무 것도 이루어 낼 수 없다. 성공은 고난을 넘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인문형인간>중에서, 신광철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