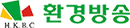한기봉 언론중재위원/칼럼니스트

며칠 전 지하철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가까웠지만 평소 잘 보지 못했던 친구다. 안부를 주고받고 나서 거의 동시에 나온 말.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그래, 연락해.” 그렇게 헤어졌다. 집에 가는데 직장 후배한테 전화가 왔다. 내가 잘 아는 누군가에 대해 한참 묻더니 전화를 끊으면서 하는 말, “언제 밥 한번 모시겠습니다.” 평생직장에서 은퇴는 했지만 나도 밥은 먹고 산다. 밥이 도대체 뭐길래 다들 밥타령, 먹는 타령이냐.
‘밥’이란 말. 우리 일상에서 이 단어만큼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말이 있을까 싶다. “밥심”을 발휘해 일을 잘 해내면 “밥값을 한” 거다. 잘 못하면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냐” 소리 듣기 십상이고, 직장에서 잘리면 “밥줄이 떨어진” 거다. “밥인지 죽인지” 뒤죽박죽 덤비다가는 “다 된 밥에 재 뿌린” 격이 되고, 그러다간 “다 된 밥에 꼬 빠뜨린” 사람 된다. 급기야 사람이 “밥통”이 된다. 내 앞길 급하다고 “찬 밥 더운 밥 가리지” 않다가는 결국은 “그 나물에 그 밥” 이상 되지 못한다. “밥그릇” 수만 따지며 고약한 짓만 “밥 먹듯” 하는 자는 “밥맛 없는 놈”이요, “먹튀”를 조심할 자다. 세상 사는 재미가 없으면 “밥맛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영원히 “밥 숟가락 놓는” 신세가 된다.
‘밥’이란 단어는 가히 우리 삶을 규율하고 정의한다. 직장과 일은 보람 있든 비루하든 다 “밥벌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삶이 팍팍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튀어 나온다. 그냥 “살기 힘들다”고 하면 될 걸 “먹고”가 따라붙는다. 한국적 정서에서는 사는 게 먹는 일이요, 먹는 게 산다는 것이다.
“밥은 먹고 다니냐?”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온 역대급 명대사다. 형사 송강호가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살인 용의자 박해일에게 툭 던진 말이다. 이 말은 그런데 인사가 아니다. “사람 죽이고도 밥이 넘어가냐” 라는 역설적 대사다. 이 영화가 외국에서 상영될 때 영어 자막은 “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냐?”(Did you get up early in the morning?)였다고 한다.
나는 30년간 한 신문사 ‘밥’을 먹었다. 동료 기자끼리는 그래서 ‘한솥밥’ 식구다. 한솥밥을 먹는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지 않은가. 영어로 회사를 뜻하는 ‘company’도 ‘com’과 ‘pan’이 합친 말이다. ‘com’은 함께 한다는 의미를 지닌 접두사인 건 알 테고, ‘pan’은 라틴어 뿌리로 빵을 뜻한다. 우리말 ‘빵’은 포르투갈어 ‘pão(빠웅)’이 일본을 통해 들어와 아예 우리말이 돼버린 거다. 스페인어는 ‘pan(빵)’, 불어는 ‘pain(뺑)’ 이태리어는 ‘pane(빠네)’다. 즉 함께 빵을 먹기 위해 만든 조직이 바로 회사인 것이다. 동료, 동반자란 의미인 ‘companion’(영어), ‘compagnon’(불어)은 ‘빵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다.
밥을 함께 먹으면 ‘식구(食口)’다. ‘먹는 입’ 식구란 단어는 촌스럽게 들리면서도 정답다. ‘가족’과는 다른 어감을 준다. “얘는 우리 식구야”라는 말은 남이 아닌 ‘우리 편’라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라는 정서에 각별한 민족이다. 서양과 달리 집단을 중시하는 우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 애를 쓴다. 우리 엄마요, 우리 가족이요, 우리나라다. 우리가 되려면 한 상에 마주 앉아 한 입이 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밥상정치’ ‘식사정치’도 나온다. 밥을 먹듯 말도 ‘먹힌다’고 표현한다.
밥은 쌀의 집합체가 아니다. 우리가 밥이라고 할 때는 먹는 음식 전부를 말한다. ‘밥상’은 밥만 올려놓은 상이 아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인 우리나라에서 왜 ‘식의주’가 아니라 ‘의식주(衣食住)’인지가 좀 이상하다.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식의주’가 보편적이라고 한다. 한국인의 체면의식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일본에서 건너온 번역이 굳어졌다는 설이 유력하다.
밥을 말하는 영어는 ‘라이스(rice)’ 하나뿐이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벼’, ‘쌀’, ‘밥’으로 단계별로 구별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어휘가 한자권 세계에서 다양하게 확장된 걸 보면 놀랍다. ‘쌀 미(米)’, ‘벼 화(禾)’ ‘먹을 식(食)’은 언어의 풍성한 밥상이다.
‘米’는 쌀알이 이삭에 촘촘히 달린 모습이다. ‘米’자 변이 들어간 글자는 모두 음식과 관련 있다. ‘粮’(양식 량), ‘糖’(사탕 당), ‘粉’(가루 분), ‘粥’(죽 죽)자에 들어있다. ‘米’를 파자하면 ‘八+十+八’이다. 이를 두고 쌀을 생산하는 데 여든여덟 번 농부의 손길을 거친다는 정성의 의미가 담겼다고들 하는데 이는 속설일 뿐이다. 하지만 어쨌든 88세를 ‘미수(米壽)’라고는 부른다. 정부가 지정한 ‘쌀의 날’도 8월 18일이다.
쌀은 벼에서 나온다. 벼 ‘화(禾)’자는 벼의 맨 위에 이삭이 고개를 숙인 모양새다. 가을 ‘추(秋)’는 벼가 불(火) 같은 햇빛에 익어 가는 계절이다. 옛날에는 세금을 쌀로 내서 ‘조세(租稅)’란 단어에는 벼 화자가 다 들어있다. 벼를 내면 무게를 재야 하니까 저울을 뜻하는 천칭(天秤)의 ‘저울 칭’에도 벼가 들어있다. 씨 ‘종(種)’자는 벼에서 가장 무거운(重) 부분이다. 사사로울 ‘사(私)’자는 정전제 하에서 내가 농사한 벼는 내가 갖는다(厶, 마늘 모, 통마늘에서 분리된 마늘 조각)는 의미에서 시작됐다. 옮길 ‘이(移)’는 벼가 많으니(多) 옮겨 심는다는 것이고, 이로울 ‘이(利)’는 벼를 칼(刂, 칼 도)로 수확한다는 것에서 나왔다.
먹을 ‘식(食)’자는 음식물을 담은 그릇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飮’(마실 음), ‘飯’(밥 반), ‘餠’(떡 병), ‘饑’(굶주릴 기), ‘餓’(굶주릴 아), ‘飽’(배부를 포), ‘餘’(남을 여), ‘飼’(기를 사) 등이 있다. 여관(旅館)이란 여행 중에 먹는 집(館)이다.
밥은 요리하는 게 아니다. 집이나 옷, 농사, 이름처럼 ‘짓는다’고 했다. 짓는 건 만드는 행위와 다르다. 손맛이, 정성이 들어간 거다. 게다가 밥을 짓고 나면 뜸을 들이며 기다려야 한다. 어머니는 출사하는 자식에게, 먼 길을 떠나는 자식에게, 입영열차를 타는 아들에게 따스한 새벽밥 한 그릇 먹이려고 밤을 꼬박 새웠다. 그래서 ‘집밥’이다.
어느 조사에선가 직장인이 가장 선호하는 점심 메뉴가 부동의 ‘김치찌개’에서 ‘가정식 백반’으로 바뀌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집밥에 대한 갈망은 역설적으로 집밥의 부재를 말한다. ‘햇반’과 ‘혼밥’의 등장은 가족의 분해요, 밥상공동체의 해체요, 밥상머리 교육의 실종이다. 자식이 어리든 크든 엄마가 상추에 꼭꼭 쌈을 싸서, 생선가시를 알뜰하게 발라서, 호호 식혀서 “자. 입 벌려” 먹여주는 건 아마도 우리나라뿐일 게다. 시골에 사는 노모가 전화로 “밥은 먹었나?”하면 눈물이 난다. 질문이 아니라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는 아직도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매년 택배비 들여가며 쌀을 부친다.
잊혀가는 우리말에 ‘대궁’이란 단어가 있다. 삼시세끼를 먹는 일이 어렵던 시절, 손님이라도 오시면 식구 중 누군가는 굶어야 했다. 손님도 주인의 형편을 알고 밥을 절반쯤 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남긴 밥이 대궁, 대궁밥이다. 물린 상은 남은 식구들이 먹는다. 지금의 잔반(殘飯)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다. 음식에 대한 진지한 태도, 어른에 대한 공경이다. 밥상 받는 순서의 위계질서가 있던 시절, 사랑방의 바깥어른이 안채나 부엌채의 아녀자에게 음식을 물리면 그걸 다시 정갈하게 차려 먹는 것도 ‘대궁상’이다.
“언제 밥이나 먹죠”로 돌아간다. 이 말이 정말로 식사를 하자는 의미는 꼭 아니라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다. “밥 먹었어요?”처럼 그냥 인사치레다.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을 보탠 거다. 그러니 빈말이라고 크게 욕할 거까진 아니다. “밥 먹자고 하더니 짜~아식 아무 연락이 없네.” 목놓아 전화를 기다릴 일도 아니다.
그래도 사실 그 말이 아무리 지나가는 인사라 해도 요즘은 좀 그렇긴 하다. 애매하다. 공수표나 날리는 신의 없는 사람 소리 들을 수도 있다. 나는 그래서 그 말을 잘 안 하는 편이다. 정말 밥을 함께 먹고 싶으면 “우리 밥 한 번 먹죠. 언제가 좋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말한다. 오랜 사회생활에서 얻은 결론. 나와 밥을 먹겠다는 가장 확실하고 진실한 의중을 가진 사람은 “오랫동안 적조했네요. 약속 없는 날짜 몇 개 주시겠어요? 제가 맞춰 볼게요. 아, 그리고 좋아하는 식당 있으세요? 제가 예약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명절이 다가온다. “우리 밥 한번 먹어야죠”라는 인사를 우리는 또 주고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