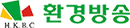'Emily in Paris"란 드라마를 보면 일과 삶을 대하는 미국인과 프랑스인(어쩌면 유럽인)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사가 나온다.
직장에서 죽기 살기로 일하는 미국인 에밀리에게 프랑스인 동료 루크가 이런 말을 한다.
"너는 살기 위해서 일하지만, 우린 일하기 위해 산다"
그러자 에밀리가 "나는 일하는 게 행복하다"며 항변한다.
이에 루크는 "아마 너는 행복하다는 게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뼈 때리는 한마디를 남긴다.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고나서 지난 2019년에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려다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결국 철회했던 일이 있었다.
그때 거리에 나와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은 노조가 아니라, 놀랍게도 프랑스의 중고교생들이었다.
"부모세대 당신들이 대통령 잘못 뽑아놓고 왜 우리 세대가 앞으로 그런 부당한 일을 감당해야 하나!"라고 외쳤다고 하니, 이 얘기를 들으며 참으로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전율을 경험했다(프랑스 고교생들이 치는 국공립대학 입학자격 시험인 '바깔로레아'의 철학 문제를 한 번 살펴보면 이들의 시위를 충분히 이해하게 됨).
프랑스에서 12시간이었던 1일 노동시간이 지난 1900년 11시간으로, 1919년에 8시간으로 단축됐다.
주당 법정 노동시간은 1900년 70시간에서 1919년 인민전선 정부가 40시간 노동법을 통과시켰고, 이후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이 주 38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여 마침내 2000년에 주 35시간제를 시행하여 지금껏 변화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또한 1936년 최초로 유급휴가제도를 시행하여 휴가 일수가 점차 증가해 오다가 지난 1982년부터 최소 연 5주가 정착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최대 15주까지 유급휴가).
프랑스에선 돈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시간 짧고 휴가가 길며 상하 수직적 권위 없이 수평적 기업문화가 보장되는(이미 법과 사회적 분위기로 일정수준이 정착되어 있음에도) 곳이 구직자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직장으로 간주된다.
"저렇게 놀기 좋아하고 게을러서 어찌 나라나 회사가 돌아가겠나!"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주변의 우리나라 사람들을 본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프랑스 독일 등 개인의 근로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적은 선진사회에 대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건 바로 '개인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눠 사회전체의 근로시간을 오히려 늘렸다'는 점이다.
우리는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일의 양과 임금의 격차를 최대한 벌리는 '승자독식' '각자도생' 사회라면,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의 유럽사회는 개인이 조금 덜 벌더라도 사회전체의 파이를 키워 공동체의 안정과 개인의 삶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존과 상생'의 사회라 할 수 있다.
퇴근 후에는 직장이나 상사가 업무관련 전화나 이멜도 못 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철저히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근로자 역시 직장을 내 가정처럼 여기며 애정과 열정을 쏟아붓는 사회적 분위기.
그래서 "당신들(한국인 포함)은 살기 위해 일하지만 우린 일하기 위해 산다"며 '그렇게 죽자 살자 일하면 어찌 능률과 효율이 생기고 창의력과 독창성이 나오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겨우 주 35시간 일하며 최소 연 5주 이상을 바캉스로 즐기면서도 우리사회보다 소득은 높고 물가는 더 싸고(2022년 물가 1위 홍콩 2위 뉴욕 10위 서울(2021년 8위)인데 반해 파리 베를린 등은 한 번도 20위 내에 없었음)빈부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낮은 선진복지사회를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 전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 조대원 페이스북 펌 글 -